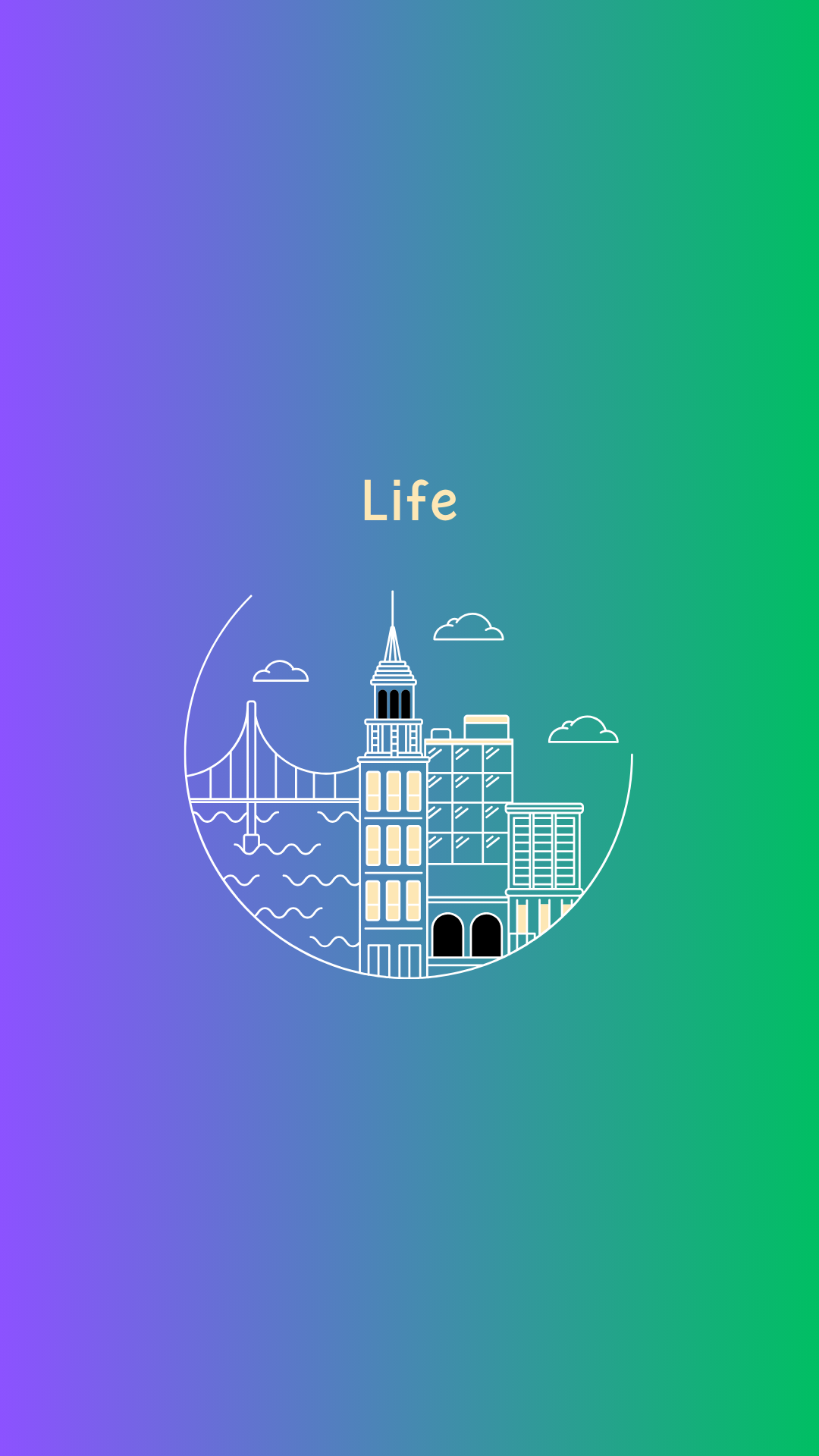저출산·고령화 시대, 우리가 직면한 현실
안녕하세요. 최근 독일의 유명 과학 유튜브 채널 ‘쿠워츠게작트’에서 공개한 영상이 유튜브, 뉴스에 큰 화제를 모았어요. 영상 제목은 다소 자극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줘요. 바로 “한국은 끝났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보자마자 뭐지? 한국이 왜 끝나?
물론 좀 과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었어요. 오히려 나른 나라에서 이슈화시켜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이제 우리도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출산율,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인구를 유지하려면 평균적으로 한 여성이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하지만, 지금은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실제로 2020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데드 크로스’ 현상도 시작됐어요.
이 상태로 가면 2040년경부터는 거리에서 아이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냥 넘길 수 없는 현실이에요.😐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줄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노동 인구예요. 일할 사람이 적어지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수 감소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죠.
그뿐 아니라,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복지 지출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이는 결국 청년 세대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프랑스, 스웨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출산율을 회복했을까요.
우리나라와 특별히 다른 점은 ‘비혼 출산’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프랑스는 아이의 60% 이상이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나요. 팩스(PACS)라는 동거 커플 등록 제도를 통해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혼외 출산,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차별 없는 지원 정책을 시행했어요.
반면, 한국은 출산의 98%가 혼인한 부부에게서만 일어나요. 비혼이나 동거 커플은 법적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시선도 여전히 차가운 편이에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한국은 수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졌어요. 이유는 명확했어요. 육아와 교육에 드는 비용 사교육, 치솟는 집값, 고강도 긴 근무 환경, 불안한 고용, 출산후 경력단절 등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식의 금전적 혜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삶 전반에서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이 제공되어야 해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출산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즉, 좋은 일자리, 안정된 주거, 양육의 사회적 책임 분담 같은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해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해요. 아직 현실은 대기업 제외하곤 남자직원이 육아휴직받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남은 직원들의 눈치가 많이 보이죠.
여성도 면접볼때 출산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죠.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지 않아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어요. 🥲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상징적이고도 강력한 경고인 거 같아요. 지금 우리는 출산율 0.7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네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